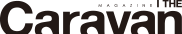TOUR Backpacking
김포 문수산성을 따라 ‘Backpacking 첫 발’을 내딛다
백패커가 되는 길은 참 쉽지만, 막상 해보니 그리 만만치 않은 길이었다. 첫 백패킹의 시작과 설레임도 잠시 20kg이 넘는 육중한 무게가 내 다리를 짓누르기 시작했다. 간만에 백팩을 짊어지는 자체가 체력적인 무리였을까, 내 몸이 그동안 도심에 열심히 적응한 탓일까. 평균 나이 30대 후반에 백패커를 자청한 세 남자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본다.
첫 백패킹, 김포 문수산으로 가자!
백패커스 라운지라는 팀명으로 세 명의 백패커가 처음 도전한 곳은 김포에 위치한 문수산(376.1m)이다. 이번 여정은 문수산 산림욕장에서 남문 성곽을 따라 홍예문, 중봉 쉼터, 문수산정상인 장대지 바로 옆에서 야영을 하고, 다음날 아침 문수산성을 따라 북문으로 내려오는 약 5km 코스를 택했다. 트레킹이라면 약 3시간이면 충분한 코스.
이런 저런 일들로 시작부터 순조롭지 않았던 백패킹은 주차장을 지나 몇 백 미터도 안되는 첫 고갯마루에서부터 체력이 고갈되어 숨을 몰아쉬기 바빴다. 뒤를 돌아보니 나만의 일은 아닌 모양이다. 문수산 산림욕장을 지나 우측의 능선으로 오르는 길은 보기보다 쉽지 않았다. 간단한 등산복장으로 오르기에는 힘든 길이 아닐 텐데 완전 군장에 가까운 백팩을 매고 오르니 고행길이 따로 없다. 백팩에 넣은 것도 많지 않은데 어깨, 허리, 다리가 차례로 고통스럽다. ‘힘들다’. 심장은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나도 이제 도심형 인간이 된 것이다.
쭉쭉 뻗은 나무 사이를 얼마나 올랐을까 깔끔하게 단장된 데크가 눈에 들어온다. 강화대교와 강화 읍내의 야경과 고려산 뒤로 노을이 지는 멋진 경치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19시 20분이 일몰 시간인데 18시가 넘어서 출발했으니 정상까지 고생길이 훤히 보인다. 백팩의 세팅이 잘못되어 힘들었던 거라며 엄팀장이 백팩의 세팅을 바로 잡아준다. 한결 낫다. 데크에서의 멋진 풍경을 뒤로 하며 헤드랜턴을 켜고 발길을 재촉한다.
홍예문을 지나 중봉쉼터까지 산길은 오르내리길 반복한다. 성벽과 나란히 걷기도 하고, 우회하기도 하고, 로프를 잡고 사력을 다해 올라간다. 1시간 30분 정도가 지나자, 드디어 정상인 장대지가 희미한 불빛에 모습을 들어낸다. 둥그런 형태로 성처럼 쌓아올린 장대지는 숙영지로는 좋지 않아 보인다. 거기다가 바람은 왜 이리 불어오는지 배도 고프고, 허리도 아프고, 춥기까지 한다. 어디다 텐트를 쳐야 좋을지 여기 저기 다녀봐도 3동의 텐트를 칠 마땅한 자리가 없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정상 아래 작고 편평한 자리를 오늘의 베이스 캠프로 선택했다. 5분 남짓, 텐트 3동을 치면서 동시에 늦은 저녁을 차리기 시작했다. 텐트를 고정하기 위해 팩을 박아보니 어디 하나 팩이 들어가는 곳이 없다. ‘아뿔싸, 땅이 아니다.’ 바닥은 예전 군인들이 쓰던 벙커였는지 콘크리트 덩어리였다. 할 수 없이 주변의 돌들을 찾아 바람에 날아가지 않길 바라며 정성껏 눌러두었다.
리액터에 3인분 밥을 짓고 반찬과 먹거리를 꺼낸다. 급한 마음에 불조절을 실패해 3층 밥을 지었지만 세 명의 장정이 숟가락을 들자 금세 바닥을 보인다. 다들 시장했던 모양이다.
먹고 나니 슬슬 어둠에 눈이 익숙해져 주위가 보인다. 정상 아래쪽의 공간은 아늑했지만 바람이 멈추지 않고 계속 들어온다. 침낭을 꺼내고 잠자리를 정리한 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어본다.
“간만에 산에 오르려니 예전 같지 않은데요.”, “하지만 이렇게 정상에 올라 텐트를 치고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자체가 백패킹의 매력 같아요.”
백팩의 명품, 미스테리 랜치를 수입하는 유인터내셔널의 김차장, 엄팀장, 그리고 나. 간단하게 맥주 한 캔을 마시며 굵고 짧은 첫 백패킹의 하루를 마감했다. 다들 고단했는지 서로의 텐트로 향했다. 그렇게 백패커들의 첫 출정은 하루를 넘겼다.
바람 소리와 텐트가 나부끼는 소리를 들으며 밤을 새니 텐트 밖으로 여명이 느껴진다. 텐트와 침낭 속에서 뒹굴거리다가 몇 분 후 텐트 밖으로 나왔다. 백패킹의 첫 야영은 JEEP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익스트림 라인의 텐트로 백패킹용(4.2kg)으로는 다소 무겁지만 2~3명이 동시에 취침이 가능하고, 디자인도 깔끔한 실용적인 타입이었다.
강화도쪽은 어제와 같이 가시거리가 짧다. ‘구름도 많이 몰려 있는 것이 비가 오려나…’
일행들도 텐트 밖으로 몸을 내민다. 다들 푹 잔 모양이다. 바람이 심하게 불어 바위 뒤에서 아침밥을 해본다. 그래봐야 물을 끓이고 인스턴트 식품에 물을 부어 따뜻한 국물과 함께 끼니를 떼우는 정도였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은 한결 편하다. 자연속의 하루, 힐링이 된 것일까? 텐트와 매트를 접고 백팩을 다시 꾸려본다. 어제보다 한결 가벼운 느낌이다.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불필요한 것인지 이제서야 감이 온다. 백패킹에 있어 장비들의 무게가 왜 가벼워야 하는지 실감한다. 백팩 하단에 매달았던 매트도 배낭안쪽에 넓게 펴서 벽을 만들고 침낭과 옷들을 넣은 후 텐트는 배낭 윗부분에 결합했다. 백패킹 시 길이 방향으로 배낭안에 넣기보다는 배낭 위쪽에 얹어서 들고 가는 것이 유리했다.(하략)
writer 표영도 + photographer 엄재백 + 제품협찬 백팩 (미스테리 랜치), 텐트 (jeep)